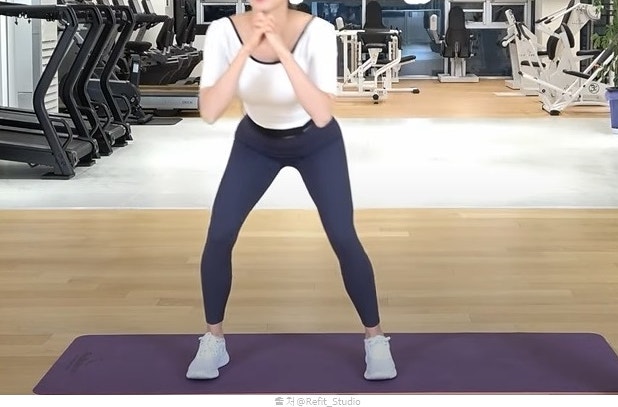하늘의 구름이 신비한 계절시와 잘 어울리는 계절 가을입니다.~늦은 사랑 / 이렇게 늦은 사랑
석불은 눈을 한번 감고 뜨면 모래무덤이 되는 눈깜짝할 새도 없다
넌 모든게 순간이었다고 하지마 달은 윙크를 한번 하는데 한달이나 걸려

빗소리/안도현빗소리
저녁 식사 직전인데도 마당이 떠들썩하다
문을 열어보니 빗줄기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진을 치고 있다
둥근 투구를 쓴 병사들의 발소리가 마치 빗소리 같다
부엌에서 물끓이는 것이 툇마루로 기어오르다
왜 빗소리가 나서 저녁을 이렇게나 걷게끔 음식을 장만했는지
빗소리가 외롭지 않도록 마당 쪽으로 길게 귀를 열어 두다
그리고 낮에 본 무릎이 부러진 어린 절구의 안부가 궁금하다.

안도현 시인의 시를 굉장히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좋지만 안도현의 시는 안도가 되는 (웃음) 뭔가 모르는 공감대가 느껴지는 시인, 어렵지 않게 써도 되고요.
새들의 페루/신용목 새들의 페루
새 둥지에는 지붕이 없는 대나무에 부리를 물고 폭우를 맞는 고독, 젖어 마르는 깃털의 고요함이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순간은 운명을 짊어지고 오는 도심 한복판, 갑자기 솟아오르는 검은 자루를 꽉 물고 놓지 않는 바람의 위턱과 아래턱, 풍치의 자극으로 박힌
공중의 검은 과녁, 중심은 어디에나 열려 있다.
둥지를 휘감는 회오리 독이 뿔처럼 여물어서
하늘을 향한 단 일격을 노리는 것
새들이 급소를 찾아 빙빙 돌다
밝은 공중의 캄캄한 숨통을 보여줘! 바람의 어금니를 통해서 그곳을 때리면
평생을 사서 잘린 뿔처럼 나아가는데 바쳐도 된다니 죽음의 여운을 방행하라
하늘에 등을 대고 자는 짐승, 고독은 하늘이 무덤이다.갑자기 검은 자루가 공중에 무덤을 파듯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새는 지붕을 지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새집은 지붕이 없네.이 하늘을 짊어지고 사는 새집은 지붕을 만들지 않는다.
목련/김경주말에 누워서 자고 일어났다.12년간 혼자 살았다.
삶이 영혼의 청중들이라고 생각한 이후 단 한 번만 사랑하려다 세상에 그늘지고 사라진 나무와 인연을 맺는 것 또한 축축하다.문득 목련은 그때 일어난다.
저 목련의 발가락이 내 연인들을 내비친 이사 때마다 기차 짐칸에 싣고 온 자전거처럼 나는 그 바람에 다시 다가오는 얼마나 많은 거미들이 나무 성대에서 입을 벌리고 말라가고, ‘ㅅ’이야말로 꽃은 넘어오는 것이다.화상은 외상이 아니라 내부 바닥이다.문득 목련은 그때 보인다.
이를 붉게 적신 사랑아 목련의 그늘이 너무 뜨거워서 우는지
나무에 목을 걸고 죽은 꽃을 보는 인질을 놓아주듯 목련은 꽃잎의 목을 다시 조용히 놓아주는 그늘이 비릿하다
김용택 시인이 <시가 내게 왔다> 3>에서는 김경주의 <목련>에 덧붙인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 작가 등은 직업이 아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시인’이라고 하지 않고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이 시인의 말이다. 희곡작가, 공연기획자, 출판기획자는 그의 또 다른 직업이다. 미술 사진 음악 등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한다. 내연이든 외연이든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형식적 한계를 느낄 때 영화나 공연 등 공간의 몸을 빌리는 것입니다, 또 연극 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시의 세계로 가져옵니다. 모든 작업이 시의 자기장력을 바탕으로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암암리에 만든 확실한 도발자다.그의 몸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기운을 그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꿈을 현실로 가져왔고 문득 목련을 함부로 피울 것 같다.
멋진 시와 하루를 멋지게 보내세요.
좋아요와 이웃추가 댓글은 저에게 비타민이네요감사합니다。^^